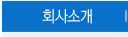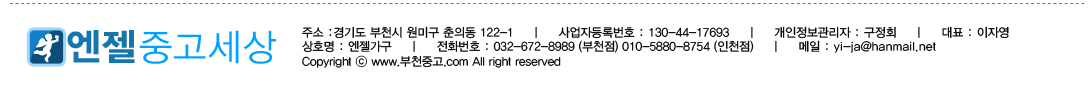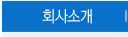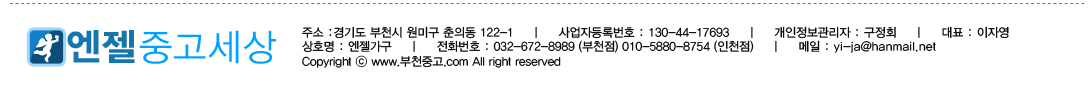>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9년 12월9일 국가가 강제한 ‘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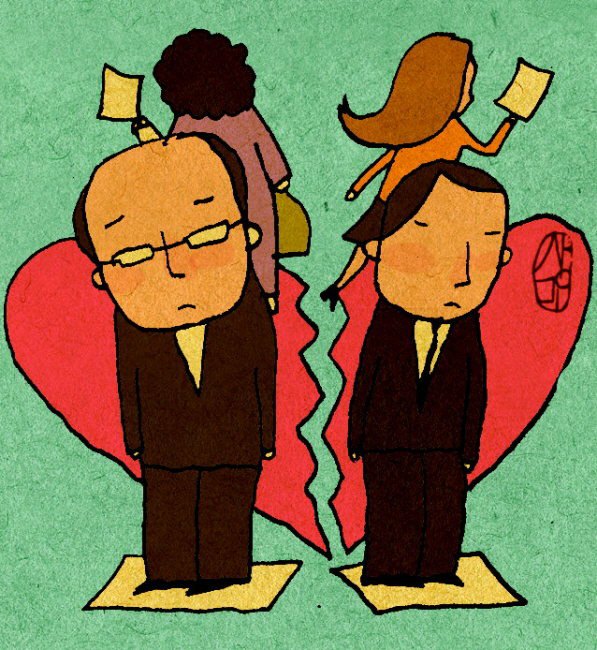
가부장적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경제권을 틀어쥐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는 남편.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없다면?
20년 전 오늘은 한 70대 할머니 ㄱ씨의 이야기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ㄱ씨는 50년 넘게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다 “남은 인생 홀로 살고 싶다”며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ㄱ씨는 1946년 남편 ㄴ씨(84)와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지만 남편은 경제권을 틀어쥔 채 최소한의 생활비만 줬습니다. 돈을 꽤 벌었으면서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뜻에 거슬리면 욕설과 주먹질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의처증이 생겨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가 하면 치매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 1997년 5000여만원을 들고 큰딸 집으로 피신하자 남편은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남편을 정신과로 데려가 ‘망상장애’라는 소견서를 받아낸 뒤 1997년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 가정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행·폭언과 지나친 의심 등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힘든 점이 인정되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7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혼생활이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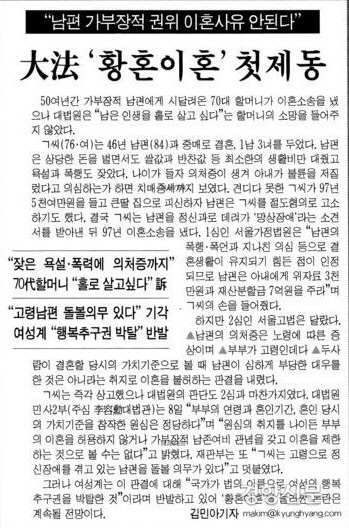 1999년 12월9일자 경향신문 27면 1999년 12월9일자 경향신문 27면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고법은 남편의 의처증이 노령에 따른 증상이고, 부부가 고령인데다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ㄱ씨는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부부의 연령과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을 참작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취지를 나이든 부부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 관념을 갖고 이혼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ㄱ씨는 고령으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성계는 반발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이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약 열흘 앞선 그해 11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있습니다. 대법원은 그해 11월26일 ‘80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낸 76세 할머니에게 “해로하시라”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 무렵 ‘황혼 이혼’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1990년대 말입니다.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황혼이 되어서야 자유를 찾으려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가부장제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999년 12월13일 서울 서초동에서 황혼이혼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999년 12월13일 서울 서초동에서 황혼이혼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산이 두 번 바뀐 지금은 황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6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60대 중년 10명 중 4명은 ‘상황에 따라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은 실제 이혼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3월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60세 이상 이혼건수(남성 기준)는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 10만8684건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각자 생활하는 ‘졸혼’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42.2%가 ‘졸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장도리
|